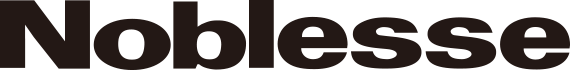-
LIFESTYLE
- 2024-10-25
낙원을 찾아서
유럽의 회화와 희곡, 역사적 사건을 통해 문화 칼럼니스트 정준호는 낙원을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상상력을 떠올렸다.
낙원은 어디에
지난 5월 나는 빈과 파리, 런던을 관통했다. 하늘을 날고, 해저터널을 지났으며, 들판을 달렸다. 콘서트와 오페라를 감상했고, 몇 번씩 드나들었음에도 박물관을 나설 때마다 아쉬워했다. 100년 전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인류의 꿈은 한 가지, ‘낙원행’이 아닐까.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중 ‘환희의 송가’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환희여, 아름다운 신들의 불꽃이여, 낙원(Elysium)의 딸이여.” 환희를 낙원의 딸로 은유한 것이다. 한편 파리의 샹젤리제(Champs-Elysees)는 ‘엘리시움 들판’이란 뜻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엘리시움은 영웅들의 영혼이 머무는 낙원을 의미한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베토벤 벽화’ 속에서는 엘리시움의 딸들이 하늘을 날고 있다. 그리고 빈 시립 박물관에서는 그와 같은 여인들이 주피터의 번개, 마르스의 투구, 헤라클레스의 사자 가죽, 아폴론의 리라에 둘러싸인 사랑의 신 아모르 주위로 날아오르고 있는 방이 자리한다. 이 ‘공기의 정령’을 무대에서 보여준 의상도 있다. 바로 발레리나 파니 엘슬러의 날개옷이다. 뒷날 그녀가 섰던 황실 극장은 허물고 새로 지었는데, 그 모습이 1888년 클림트의 붓끝으로 기록됐다. ‘옛 부르크 극장의 관객석’에 등장한 많은 명사 중에는 요하네스 브람스도 있다.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다가옴을 예감했는지 부루퉁하다.
며칠 뒤 바다 밑을 지나 런던 세인트판크라스역에 내렸다. 해리 포터는 세인트판크라스역과 교차하는 킹스크로스역의 ‘9와 3/4’ 승강장에서 마법 학교 호그와트로 가는 기차를 탄다. 내 여정도 그 못지않게 흥미진진하다. <리처드 2세>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 지명이 가장 많이 나온다. 윈저성과 웨스트민스터 사원, 코번트 가든과 홀번을 오가는 런던에 그치지 않고, 코번트리, 브리스틀, 웨일스(할렉성과 플린트성), 요크(폰테프랙트성), 버클리, 글로스터를 종횡무진 누빈다. 영화도 아닌 한정된 무대 상연임을 생각하면 과감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희곡은 하루 동안 한 장소에서 일어난 한 가지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삼일치법칙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셰익스피어의 런던 관객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극장의 제약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했다.
윈저성의 리처드 2세는 병석에 누운 숙부가 뵙기를 청한다는 전갈을 듣고 길을 나선다. 그는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숙부가 죽기를 바라지만, 왕의 바람과 달리 숙부는 그를 맞이한다. 외려 그것이 더욱 화를 불러 왕이 돌아서자마자 숙부는 운명하고 만다. 빠른 공간의 이동은 플롯에 속도감을 가져다준다. 숙부의 아들 헨리, 곧 왕의 사촌은 국외로 추방되었다가 은밀히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왕의 숨통을 조인다. 헨리의 이동 경로는 대사 한 줄에 불과하나 이는 잉글랜드를 사선으로 양분한다. 모두 손바닥만 한 무대 위에서 벌어질 일이다.
신석기시대 웨일스인(켈트족보다 훨씬 이전 원주민이다)은 거대한 돌덩이를 <리처드 2세>의 격전지를 가로질러 솔즈베리 평원까지 가져왔다. 이 스톤헨지(Stonehenge)에는 여러 천문 정보가 녹아 있다. 하지의 일출과 동지의 일몰에 따른 돌 배치는 달의 공전주기도 암시한다. 천문 연구를 목적으로 스톤헨지를 세웠을 리는 없고, 아마도 종교 제의와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뒷날 동지는 크리스마스, 하지는 성 요한의 날 기원이 되었다. 셰익스피어는 하짓날 밤 한바탕 사랑 소동을 <한여름 밤의 꿈>에 녹였다. 배경은 스톤헨지가 아닌 아테네 밖 숲속이지만 말이다.
꿈의 여정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의 상상력은 훨씬 멀리 떨어진 공간과 시간의 일을 거의 동시에 일어난 듯이 뒤섞는다. 스톤헨지에서 가까운 코츠월즈(Cotswolds)는 제인 오스틴의 주요 소설에 영감을 준 장소다. 그림 같은 전원에 옹기종기 자리한 고택은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샤이어(shire)’처럼 보인다. 샤이어는 접미사로 쓸 때 발음이 ‘-셔’로 바뀐다. 글로스터셔, 요크셔처럼. 톨킨이 배우고 가르친 옥스퍼드는 해리 포터의 교정이다. 포터와 친구들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생활하며 빗자루를 타고 공중전을 벌인다. 오랜 세월 인류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땐 빠르게 날아야 한다고 뇌리에 새겼다. 클림트의 그림에서도 보았듯이 낙원은 뛰거나 헤엄쳐서가 아니라 날아야 갈 수 있다.
최근 파리 올림픽에 등장한 성화를 실은 기구는 프랑스가 인류의 비행에 이바지했음을 상기시켰다. 상상력은 인류가 날기 위한 노력에 기름을 부었다. 쥘 베른은 <지구에서 달까지(De la terre a la lune)>(1865)로 우주여행의 청사진을 제공했다. 이후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한 만국박람회 때는 파리에 에펠탑이 들어섰다. 흉물이라는 비난에 철거될 뻔했지만, 에펠탑은 운 좋게 살아남았다. 1895년에는 러시아인 콘스탄틴 치올콥스키가 에펠탑을 보고 우주 엘리베이터 개념을 떠올렸다. 1902년, 조르주 멜리에스는 쥘 베른의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 <달나라 여행(Le voyage dans la lune)>을 찍었다. 셰익스피어가 이룬 무대 확장이 영상 속에서 지구 밖까지 뻗친 것이다. 1903년, 미국의 라이트형제가 마침내 동력 비행에 성공했다. 같은 해 치올콥스키는 <반작용 모터를 이용한 우주 공간 탐험>이라는 논문으로 엘리베이터가 아닌 로켓의 이론적 토대를 닦았다. 1957년 치올콥스키 탄생 100주년을 맞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다. 이후 미국과 소련의 치열한 경쟁 끝에 간발의 차로 1969년 아폴로 11호가 유인 달 착륙에 성공한다. 꿈을 제시하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성장 모델이다. 꿈의 궁극적 목적지는 앞서 말했듯이 신이 있는 낙원이다.
1843년에는 브루넬 부자가 설계하고 건축한 템스 터널이 개통되었다. 사람이 물 밑으로 지나다니게 된 것이다. 그 밖에도 아들 이점바드 킹덤 브루넬(Isambard Kingdom Brunel)은 철도와 교량, 선박을 오늘날에 가깝게 만든 위대한 공학자였다. 2008년 런던 올림픽에서 케네스 브래나는 브루넬로 분장하고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 중 한 구절을 인용해 개회식의 막을 올렸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섬은 갖가지 소리로 터져납니다. (…) 그러다 꿈을 꾸면 구름 같은 것이 열리고 보물이 내게 쏟아져, 만일 깨어나면 다시 꿈꾸고 싶어 울곤 합니다.” 희곡에서 ‘이 섬’이란 마법의 무인도지만 브래나가 말한 건 영국이 아닌가!
사우스켄싱턴 박물관 구역은 늘 견학생으로 북적인다. 과학 박물관은 앞서 본 모든 꿈의 여정을 압축해 전시하고 있다. 그 중심은 열을 운동으로 바꾼 제임스 와트다. 자연사 박물관 블루 존에는 원래 ‘디피’라는 애칭의 거대 공룡 화석이 자리했다. 2017년부터 디피는 전국 박물관을 순회 중이다. 셰익스피어가 놀랄 일이다. 대신 천장에 푸른 고래의 뼈가 비행한다. 그리고 찰스 다윈상이 홀을 관망하고 있다. 이곳의 별명이 ‘자연의 대성당(Cathedral of Nature)’이니 다윈은 ‘자연의 대주교’쯤 되지 않을까? 나는 인근 왕립 지리학회 담장에서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인사했다. 선교사였던 그는 아프리카 가장 깊숙이 도달해 웅장한 폭포에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선사한 인물이다. 모처럼 맑은 햇볕을 만끽하고자 길 건너 하이드 파크를 가로질렀다. 헨리 무어가 세운 ‘아치’는 스톤헨지에 비하면 소박하다. 그래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이상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그날 저녁에는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언드라시 시프가 지휘하는 ‘멘델스존 교향곡 시리즈’ 마지막 연주회를 관람했다. 유대인 멘델스존이 기독교로 개종한 뒤 작곡한 성악 교향곡이 대미를 장식했다. 시편 마지막 구절 “숨 쉬는 모든 생명이여, 주님을 찬양하라”에 붙인 선율이 런던의 밤공기에 스며들었다. 며칠 뒤 뉴스에는 하짓날 얼빠진 환경운동가들이 스톤헨지에 주황색 스프레이 물감을 뿌려대는 모습이 나왔고, 지난여름은 역사상 가장 더웠지만 기록은 곧 깨질 것이라 한다. “신이시여, 낙원은 아직 멀었나요?”
에디터 김혜원(haewon@noblesse.com)
글·사진 정준호(문화 칼럼니스트)